<나비> 남산 작가 예비교실 : 박채빈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07일 입력 : 2019년 12월 07일
<나비> ㅡ 남산 작가 예비교실 : 박채빈
"아라야 !"
내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울려퍼졌다. 어둠속에선 나비 수천마리가 날아다녔다. 울음섞인 내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수록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갔다.
저 멀리서 아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손을 허우적 거렸지만 손에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밖에 잡히지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려고 하는 순간,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떴다.
"왜 .. 왜 또 이 꿈인거지 ?"
베개와 침대 시트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이제 괜찮을거라고 생각했는데 ...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이, 일주일에 한번 꼴로 날 괴롭힌다.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탁상 위에 놓인 시계를 흘긋 보았다. 오전 4시 40분. 일어나기엔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시 잠들 용기가 나지 않아 안경을 집어들고 차가운 나무바닥 위에 발을 얹었다.
2018이 무르익어가던 가을날, 나는 아라와 시내에 가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런데 아라가 학교 동아리 때문에 늦게 되자 나는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하고 말았다. 평소 너무 착하고 화를 내지 못했던 아라는 나의 재촉에 길을 뛰어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다 내 잘못이야. '빨리 와' 가 아니라 '괜찮으니까 천천히 와' 였어야 했는데 . 차라리 그날 약속을 잡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 내가 아라랑 친구가 되지 않았다면, 아라는 죽지않고 잘 살고 있을 터였다. 아라의 장례식장에선 모든 사람들이 내 잘못이 아니라며 나를 토닥였다.
하지만 난 그들의 눈동자에서 다 읽을 수 있었다. '다 네 잘못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라는 죽지 않았을거야' 그날 저녁, 나는 아라가 내게 줬던 나비 열쇠고리를 움켜쥐며 하염없이 아라를 부르고 , 부르고 , 또 불렀다.
오늘따라 아라가 더 생각나 학원까지 빠지고 펑펑 울며 집으로 향했다. 집 앞 정원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팔랑거리는 날갯짓으로 꽃에 살포시 내려앉는 나비가 눈에 띄었다. 그 순간 아라와 내가 나눴던 말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유민아 , 너는 뭐가 좋아 ?"
해맑게 웃으며 말하던 너의 목소리.
"나 ? 나는 꽃이 제일 좋아. 너무 예쁘잖아."
"우와 멋지다 ! 나는 나비가 제일 좋아. 나도 나비처럼 훨훨 날아 오르고 싶어"
아라는 나비를 좋아했다.
팔랑거리며 꽃에 내려앉는 그 날갯짓이 , 자유롭게 꽃밭을날아다니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했다. 왜 이제서야 눈치 챘을까? 너의 모든 말과 꿈의 의미를.
어느 순간 나비가 내 손등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나비를 바라보는데 계속 눈앞이 희뿌얘졌다. 왜 이러지 싶으면서도, 뜨거운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져도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잘 지냈어 ?"
안 나오는 목소리를 간신히 입 밖으로 내었다. 나비는 대답이라도 하듯 내 주위를 빙빙 돌다가 다시 꽃으로 날갯짓을 했다. 그 작은 날갯짓이, 그토록 아름다워보이긴 처음이었다. 나뭇잎에 부서진 오후의 햇살이 우리 둘의 사이를 비추었다.
.
.
"아라야 !"
...뭐지? 또 이꿈인가? 그런데 이번엔 확실히 느낌이 달랐다.
"유민아 !"
이젠 너의 목소리가 확실히 들렸다. 팟 하고 햇살이 켜지며 꽃밭이 나타났다. 너가 저만치서 웃는 얼굴로 뛰어오고 있었다.
"보고싶었어 .. 그리고 , 너무 미안해"
나는 눈물 걸린 눈동자로 말했다. 나비 한마리가 날아오며 내 귓가에 앉았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나비가 말하는 건지 , 아라가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다. 그 어떤것도 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너의 친구라서 행복했고, 기뻤어"
조곤조곤 말하는 너, 나비의 목소리가 꽃밭을 울렸다. 손을 잡는 순간 , 너는 수천마리의 나비가 되어 멀리 날아갔다. 잘가 , 친구야 .
조심스레 눈을 떴다. 배게와 침대시트가 젖어 있지 않았고 ,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온 아침햇살이 바닥을 비췄다. 따스해진 나무 바닥을 밟고 나비 열쇠고리를 집어 가방에 달았다. 그러고는, 힘찬 발걸음으로 문을 열어젖혔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인 것처럼 말이다.
|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07일 
- Copyrights ⓒ인터넷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함양군 공고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915-210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가축시장) 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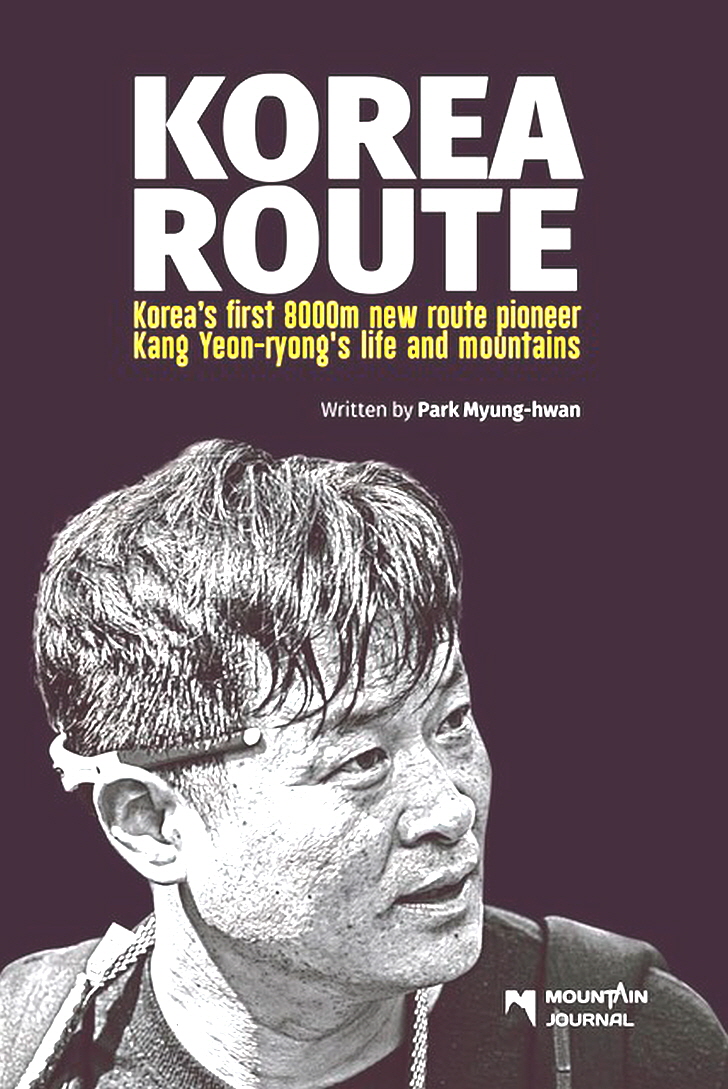


 【공고·고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
【공고·고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

